1979년에 코닥에서 일하던 스티븐 사순
(Steven Sasson)이라는 사람이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질’이라는 사전적 정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가 매일 만드는 필름에 대해서 6살짜리에게 설명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랍니다. 그 뒤에 연구실에 돌아오니 세상의 소리를 담는 그릇도 보이더래요. 카세트 테이프였죠. 그리고 ‘카메라 렌즈에서 나온 이미지가 왜 필름이라는 그릇으로만 가야 하지?’ ‘같은 그릇 이니까 카세트 테이프라는 그릇으로 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거쳐서 ‘그 둘을 붙여 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우리 인류사는 이런 식으로 진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가면 톱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마케터들이 자신이 만들고, 개발하고 파는 물건을 근처의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에까지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다양성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재능 기부, talent donation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것을 talent partnership이라고 부릅니다. Give and take, 즉 설명하면서 얻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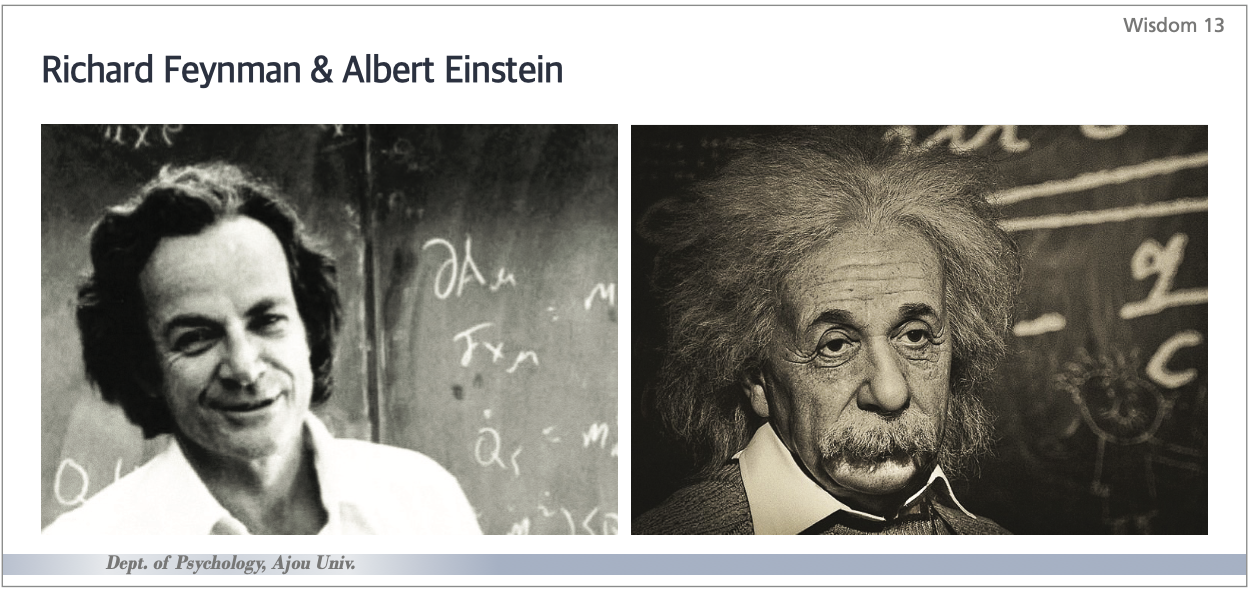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학자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리처드 파인만
(Richard Feynman)입니다. 파인만의 IQ는 120대로 아인슈타인과는 60이나 차이가 났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손꼽힌, 뛰어난 전문가들 이었습니다. 그 둘은 모두 대학 학부 1학년생, 심지어 고등학생들에게도 자주 물리학을 가르쳤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질문을 받으러 갔던 것입니다. 동네 마트 캐셔
(cashier)나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물리학을 가르쳤답니다. 전문용어와 약어를 쓸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들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위대한 두 명의 물리학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 분야, 내게 친숙한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영국제음악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도 이야기하고 음악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심리학을 설명하고, 또 그분들에게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일을 일반화시키고, 거리를 두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면서 서로가 몰랐던 통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뮤지카콰르텟이라는 연주자분들과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도스토예프스키를, 그분들은 차이코프스키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도스토예프스키를 주제로 연주하고, 저는 차이코프스키에 대해 말을 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좀 생소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각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었던거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시면서,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AI가 갖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그것을 한번 가져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