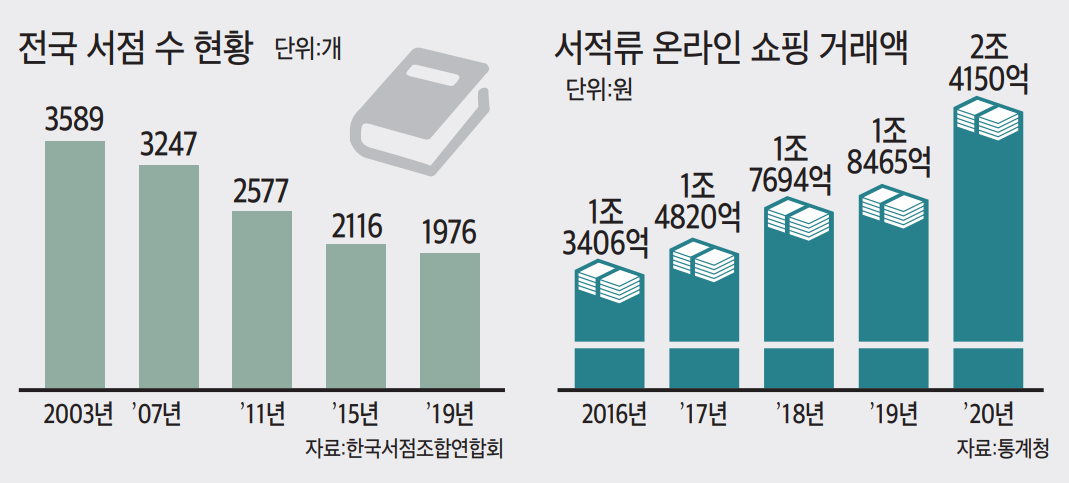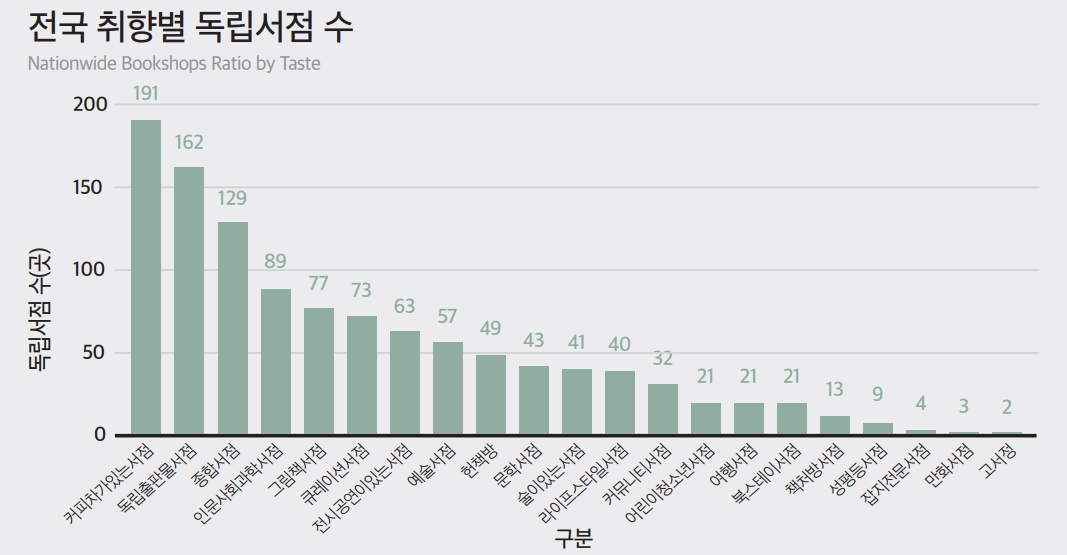어린이책 출판은 조악하기 짝이 없었고 그림책이라는 건 존재도 알지 못했던 시절. 텔레비전이 있는 집도 동네에 한두 집이었고 유일하게 라디오가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었다. 이어폰이란 게 없던 시절,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볼륨을 죽인 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노래들과 라디오 극을 통해 내가 사는 넓은 세상을 상상했다.
성년이 되고 내 맘대로 세상을 돌아다닐 최소한의 자유가 허락되었을 때 가장 즐겨 가던 곳은 대학 도서관, 서울 종로에 있던 드넓은 서점, 그리고 음악감상실이었다. 학교와 집을 오가려면 광화문과 종로통을 거쳐야 했고, 매일매일 그 거리에 내려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지금은 없어진 종로서적, 그리고 교보문고는 영혼의 집과도 같은 곳이었다. 가까이 사직도서관과 정독도서관도 있었지만,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으로는 서점이 좋았다.
종로서적의 1층부터 5층까지 좁은 계단을 한 층 한 층 오르며 내가 살 수 없는 수많은 책의 표지를 손가락으로 훑어 갈 때 심장이 뛰었다.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로 받은 첫 월급을 가방에 챙겨 넣고 교보문고로 달려가 넋을 놓고 책을 고르다 봉투째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의 황망함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끝이 시리다. 하루 종일 백화점에 서서 얼굴 근육이 아프도록 웃으며 내 월급보다 비싼 옷을 팔고 받은 소중한 돈이었다. 매일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살 수 없었던 고급 노트와 펜, 좋아하는 책을 사고 싶어 흥분된 맘으로 달려온 그곳에서 순식간에 빼앗겨 버린 어린 꿈도 지금은 추억이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사방 벽면이 책으로 가득한 집에 살았다. 창가엔 햇살이 따스하고 주전자엔 차가 끓고 있는 방의 한가운데에 책상을 놓고 앉아 글을 쓰는 모습 외에는 나의 미래를 달리 그려 보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내 집을 갖게 되자 처음으로 그 꿈을 이루었다. 거실 벽 전체를 책꽂이로 채우고 일반 책상 두 배 크기의 커다란 책상을 놓고 앉았을 때 책과 함께하는 진정한 나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 집의 거실은 곧 동네 도서관이 되었다. 밖에 나가 뛰어놀기만을 좋아하는 아들을 책으로 붙들어 두기 위해 아이 친구들을 불러들였다. 모아 놓고 책을 읽어 주었고, 원고지를 주고 글쓰기를 시켰다. 돈도 받지 않고 마을 아이들과 읽기와 쓰기를 한다고 하니 동네 학부모와 아이들이 기뻐하며 모여들었다. 응원에 힘입어 집 옆의 건물 한 켠을 세내어 집에 있던 책꽂이와 책을 들고 나갔다. ‘작은도서관’ 간판을 처음 달던 날은 동네 잔칫날이었다. 이웃 주민들이 해 온 떡과 음식을 나누며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길 바랐다. 그렇게 십 년.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게 되었을 때 나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도시에선 이루기 힘든 꿈꾸는 책들의 마을을 만드는 것.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다정한 책들의 속삭임 속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찾는 공간. 그 마을에선 아이들이 책과 함께 뛰놀며 때로는 그곳에서 길을 잃어 보기도 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방문했던 원더랜드를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곳. 책들이 버려지지 않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계의 끝, 원더랜드. 그곳에 살고 싶었다.
꿈의 자락을 따라 충청북도 괴산, 머나먼 시골 숲속에 책으로 가득한 집을 만들고 피리를 불었다. 피리 소리 따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끌려왔다. 매일매일 책을 읽고, 책을 권하고, 함께 나누고 글을 쓰며 살아왔던 ‘숲속작은책방’의 시간들. 그렇게 또 한 번의 십 년 세월이 갔다. 그러나 아직 내 마음속 원더랜드, 내가 꿈꾸었던 책들의 이상향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여전히 길 위에서 꿈을 꾸고 있는,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그들과 때론 한탄을, 때론 응원과 격려를 나누며 끝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

숲속작은책방 전경
출처: 필자 제공